'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시인의 '묵화(墨畵)'라는 시다. 이 시에서 독자들이 주목하는 시어가 있다. 바로 '소'와 '할머니 손'이다. 짧지만 동양적인 여백이 느껴지는 이 시는 '소'에서는 고단함이, 또 '할머니 손'에서는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공감의 영역을 한없이 넓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소를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우리는 진한 감정이입으로 간단치 않은 서사를 그려 내는 것이다. 그 중심에 위로와 치유를 상징하는 '손'이 있다.
필자는 강의 중에 '수수방관'과 '팔짱'이란 단어의 서로 다른 점을 수강생들에게 물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면하다'라는 뜻의 같은 동의어라고 하나같이 말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숨어 있다. 수수방관(袖手傍觀)은 '소매에 손을 넣고서 옆에서 바라만 본다'는 뜻으로, 해야할 일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한자로 소매 수(袖), 손 수(手)자를 써서 소매 깊숙이 손을 넣고 꺼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전혀 도와 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팔짱은 다소 내용이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는 팔을 들어 엇갈린 자세로 서로 끼우거나 팔꿈치를 중심으로 양쪽 팔뚝을 서로 꼰 상태에서 양쪽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 위치에 얹어 두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들어 보자'라는 뜻이 숨어 있다. 다소 냉소적이긴 하지만 일단 사정을 들어 보고 처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가벼이 지나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수수방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을 완전히 감추느냐', '어느 정도 보여 주느냐'의 차이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하다'는 착수(着手) 즉 '어떤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그만큼 손이 주는 상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의미는 중대하다. '손을 씻는다' '손을 놓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 '손을 끊다' '손을 닦다' 등과 같이 어떤 일을 그만 두거나 끝낸다는 뜻에도 이렇게 많은 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인 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또 '손님'을 뜻하는 손이며, '사람에게 해꼬지하는 나쁜 액운'을 뜻하는 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귀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불운이나 악운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빨래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 겨울 강풍에 추락하지 말자고 / 없이 사는 게 죄는 아니니 힘내자고 / 해뜰 날은 반드시 온다고 / 엄마와 아들이 / 아빠와 딸이 / 행여 떨어질까 동여매고 있다 // "딸아 / 아빠 손을 놓치지 말거라 / 오빠 손도 절대 놓으면 안된다" // 뚝뚝 끊어지는 관절이 아픈 줄도 모르고 / 꽁꽁 얼어붙은 손을 / 죽을 힘을 다해 부여잡고 있다' 필자의 시 '빨래의 손'이다. 이 시에서의 손은 가족과의 결속을 통한 각별한 정을 은유하고 있다.
포기나 외면 혹은 무관심 그리고 나쁜 운명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손'의 의미보다 추락하지 말자고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버티는 '빨래의 손'으로 상징되는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을 통하여 든든한 버팀목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주위에서 홀대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긍정적인 '손'의 의미만 간직해야 한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도 희망을 갖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남의 아픔이나 고통스런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수수방관하지 말자. 여차하면 손을 놓겠다는 심사로 팔짱을 끼고서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서 손을 뺄 순간을 노리지 말자. 평생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강요당한 소에게 다가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늦었지만 다 늙어 주름진 손이라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소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설움 받는 이 시대의 처절한 '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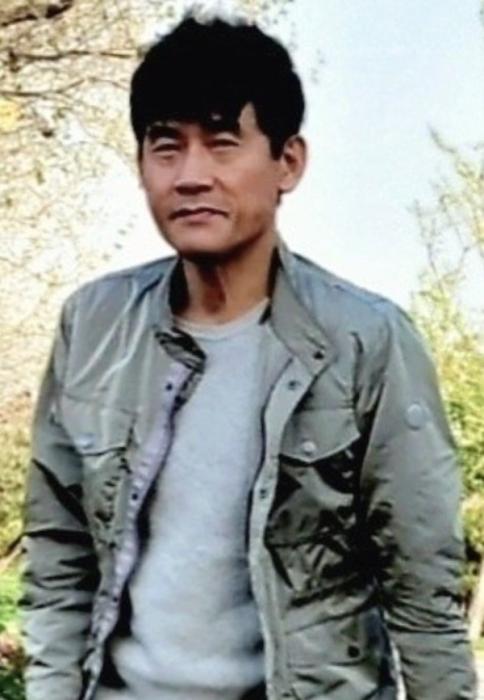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시인의 '묵화(墨畵)'라는 시다. 이 시에서 독자들이 주목하는 시어가 있다. 바로 '소'와 '할머니 손'이다. 짧지만 동양적인 여백이 느껴지는 이 시는 '소'에서는 고단함이, 또 '할머니 손'에서는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공감의 영역을 한없이 넓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소를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우리는 진한 감정이입으로 간단치 않은 서사를 그려 내는 것이다. 그 중심에 위로와 치유를 상징하는 '손'이 있다.필자는 강의 중에 '수수방관'과 '팔짱'이란 단어의 서로 다른 점을 수강생들에게 물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면하다'라는 뜻의 같은 동의어라고 하나같이 말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숨어 있다. 수수방관(袖手傍觀)은 '소매에 손을 넣고서 옆에서 바라만 본다'는 뜻으로, 해야할 일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한자로 소매 수(袖), 손 수(手)자를 써서 소매 깊숙이 손을 넣고 꺼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전혀 도와 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그러나 팔짱은 다소 내용이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는 팔을 들어 엇갈린 자세로 서로 끼우거나 팔꿈치를 중심으로 양쪽 팔뚝을 서로 꼰 상태에서 양쪽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 위치에 얹어 두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들어 보자'라는 뜻이 숨어 있다. 다소 냉소적이긴 하지만 일단 사정을 들어 보고 처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가벼이 지나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수수방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을 완전히 감추느냐', '어느 정도 보여 주느냐'의 차이다.'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하다'는 착수(着手) 즉 '어떤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그만큼 손이 주는 상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의미는 중대하다. '손을 씻는다' '손을 놓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 '손을 끊다' '손을 닦다' 등과 같이 어떤 일을 그만 두거나 끝낸다는 뜻에도 이렇게 많은 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인 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또 '손님'을 뜻하는 손이며, '사람에게 해꼬지하는 나쁜 액운'을 뜻하는 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귀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불운이나 악운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빨래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 겨울 강풍에 추락하지 말자고 / 없이 사는 게 죄는 아니니 힘내자고 / 해뜰 날은 반드시 온다고 / 엄마와 아들이 / 아빠와 딸이 / 행여 떨어질까 동여매고 있다 // "딸아 / 아빠 손을 놓치지 말거라 / 오빠 손도 절대 놓으면 안된다" // 뚝뚝 끊어지는 관절이 아픈 줄도 모르고 / 꽁꽁 얼어붙은 손을 / 죽을 힘을 다해 부여잡고 있다' 필자의 시 '빨래의 손'이다. 이 시에서의 손은 가족과의 결속을 통한 각별한 정을 은유하고 있다.포기나 외면 혹은 무관심 그리고 나쁜 운명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손'의 의미보다 추락하지 말자고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버티는 '빨래의 손'으로 상징되는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을 통하여 든든한 버팀목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주위에서 홀대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긍정적인 '손'의 의미만 간직해야 한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도 희망을 갖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남의 아픔이나 고통스런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수수방관하지 말자. 여차하면 손을 놓겠다는 심사로 팔짱을 끼고서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서 손을 뺄 순간을 노리지 말자. 평생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강요당한 소에게 다가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늦었지만 다 늙어 주름진 손이라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소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설움 받는 이 시대의 처절한 '을'인 것이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시인의 '묵화(墨畵)'라는 시다. 이 시에서 독자들이 주목하는 시어가 있다. 바로 '소'와 '할머니 손'이다. 짧지만 동양적인 여백이 느껴지는 이 시는 '소'에서는 고단함이, 또 '할머니 손'에서는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공감의 영역을 한없이 넓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소를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우리는 진한 감정이입으로 간단치 않은 서사를 그려 내는 것이다. 그 중심에 위로와 치유를 상징하는 '손'이 있다.필자는 강의 중에 '수수방관'과 '팔짱'이란 단어의 서로 다른 점을 수강생들에게 물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면하다'라는 뜻의 같은 동의어라고 하나같이 말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숨어 있다. 수수방관(袖手傍觀)은 '소매에 손을 넣고서 옆에서 바라만 본다'는 뜻으로, 해야할 일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다. 한자로 소매 수(袖), 손 수(手)자를 써서 소매 깊숙이 손을 넣고 꺼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전혀 도와 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그러나 팔짱은 다소 내용이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는 팔을 들어 엇갈린 자세로 서로 끼우거나 팔꿈치를 중심으로 양쪽 팔뚝을 서로 꼰 상태에서 양쪽 손을 반대쪽 겨드랑이 위치에 얹어 두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들어 보자'라는 뜻이 숨어 있다. 다소 냉소적이긴 하지만 일단 사정을 들어 보고 처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가벼이 지나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수수방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을 완전히 감추느냐', '어느 정도 보여 주느냐'의 차이다.'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하다'는 착수(着手) 즉 '어떤 일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그만큼 손이 주는 상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의미는 중대하다. '손을 씻는다' '손을 놓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 '손을 끊다' '손을 닦다' 등과 같이 어떤 일을 그만 두거나 끝낸다는 뜻에도 이렇게 많은 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인 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또 '손님'을 뜻하는 손이며, '사람에게 해꼬지하는 나쁜 액운'을 뜻하는 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귀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불운이나 악운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빨래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 겨울 강풍에 추락하지 말자고 / 없이 사는 게 죄는 아니니 힘내자고 / 해뜰 날은 반드시 온다고 / 엄마와 아들이 / 아빠와 딸이 / 행여 떨어질까 동여매고 있다 // "딸아 / 아빠 손을 놓치지 말거라 / 오빠 손도 절대 놓으면 안된다" // 뚝뚝 끊어지는 관절이 아픈 줄도 모르고 / 꽁꽁 얼어붙은 손을 / 죽을 힘을 다해 부여잡고 있다' 필자의 시 '빨래의 손'이다. 이 시에서의 손은 가족과의 결속을 통한 각별한 정을 은유하고 있다.포기나 외면 혹은 무관심 그리고 나쁜 운명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손'의 의미보다 추락하지 말자고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버티는 '빨래의 손'으로 상징되는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을 통하여 든든한 버팀목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주위에서 홀대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긍정적인 '손'의 의미만 간직해야 한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도 희망을 갖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남의 아픔이나 고통스런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수수방관하지 말자. 여차하면 손을 놓겠다는 심사로 팔짱을 끼고서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서 손을 뺄 순간을 노리지 말자. 평생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강요당한 소에게 다가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늦었지만 다 늙어 주름진 손이라도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소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설움 받는 이 시대의 처절한 '을'인 것이다.